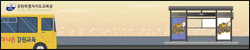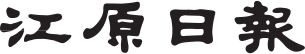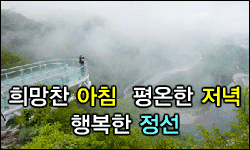포카라에서의 마지막 여정

네팔과 인도 곳곳에는 달라이 라마를 포함해 많은 티베트 난민들이 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와 살고 있다. 보따리 짐을 꾸려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나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네팔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인 부다나트, 스와얌브나트를 방문하면 참배를 하러 나온 그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다. 손바닥으로 마니차를 돌리며 스투파(불탑)를 시계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의 행렬. 불탑 앞에 자리를 깔고 절을 올리는 사람들. 이제 갓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적색 승복을 입은, 등이 굽은 노승이 목에 기다란 염주를 걸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골목으로 사라지는 풍경. 골목을 나올 때나 골목으로 들어갈 때면 어김없이 광장의 탑을 항해 합장을 하는 여인들. 그들은 모두 히말라야를 넘었거나 넘은 이들의 자손들이었다.

나는 그 골목의 끝 담벼락 아래에 쪼그려 앉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마니차처럼 쉬지 않고 돌고 도는 그들을 오래 바라보기만 했다. 희고 높은 탑에 만국기처럼 걸린 타르초(經文旗)와 장대에 걸어놓은 룽다(風馬)가 바람에 휘날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의 어느 시절을 이국땅에서 건너가고 있었다.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을 마치고 포카라로 돌아와 하루가 지나자 갑자기 걸음을 옮기는 게 힘들어졌다. 얼굴만 살짝 부었을 뿐 고산병조차 오지 않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마치 로봇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겨우 옮겨놓을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무릎을 굽히는 게 어려울 정도였다. 뒤늦게 찾아온 통증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도 소용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곳이 마사지를 하는 곳이었다. 돌처럼 딱딱해진 허벅지와 장딴지는 타인의 손을 탄 뒤에야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물을 잘못 마셨는지, 아니면 술의 여파 때문인지 다음 손님은 설사였다. 절뚝거리며 찾아간 장소마다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곳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화장실이었다.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드리듯 그 어느 때보다 내 심정은 간절했다. 그 좌변기들 위에서 엉덩이를 까고 앉은 나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어떤 기억들을 복기했던가.

내가 만약 네팔의 산속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산비탈의 밭에서 땅을 일궈 농사를 짓는 일은 아마도 지겨워했을 것이다. 높이만 차이가 날 뿐 그 일은 대관령의 농사일과 다르지 않을 테니 말이다. 아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산을 떠나 도시로 가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대단한 용기와 돈이 있어야 하니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집에서 기르는 소를 훔칠 배짱은 없을 테니까. 아마, 아마도 나는 말의 등에 물건을 싣고서 산속에 자리한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마방꾼이 되었을 것이다. 네팔의 산동네엔 아직도 마방꾼들이 있었다. 트레킹을 하는 동안 내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온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었다. 까맣게 얼굴이 탄 마방꾼들은 구배가 심한 돌계단에서도 말을 탄 채 올라가고 있었다. 떨어지면 그대로 천길만길 계곡으로 사라질 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구릉족의 젊은 마방꾼들이었다. 대관령에서 태어나고 자란 내게 그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다음 생에는 네팔에서 태어나 마방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에도 마방꾼이 남아 있을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팔의 히말라야 산자락 고갯마루에 자리 잡은 로지(Lodge)들은 대부분 저 옛날에는 마방꾼들이 쉬어가는 마방집이었을 것이다. 자동차도 드나들 수 없는 높은 산속 오지 마을에 물건을 배달하는 일은 당연히 마방꾼들의 몫이었다. 어떤 마방꾼들은 아예 눈 덮인 히말라야를 넘었다. 그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상이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설산 아래의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전해주는 마방꾼이 되고 싶다. 뜨거운 짜이 한 잔을 마신 뒤 고단한 몸을 마방집의 나무 침대에 눕히는 마방꾼. 창 너머 히말라야 고봉들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다 잠드는 고독한 마방꾼이 되는 것을 다음 생의 목표로 잡고서야 화장실을 나왔는데 비로소 설사가 진정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포카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티베트 난민촌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사랑콧 전망대가 있는 산 북쪽 아래에 자리한 그곳은 학교시설과 사원, 그리고 주변에 난민들의 주택들이 둘러싼 마을이었다. 일행 중 누군가가 담장 너머 텃밭에서 일을 하는 할머니에게 ‘나마스떼!’라고 인사를 건네자 이상한 반응이 되돌아왔다. 그 할머니는 담장으로 다가와 티베트인들의 인사는 ‘따시델레(Thasidelle)’라고 고쳐주었다. 비록 나라를 떠나 사는 곳은 네팔이지만 티베트인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았다는 표정이었다. 당연히 우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난민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따시델레!’를 아끼지 않고 꺼냈다. 사원의 불상 앞에서 승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불경 수업은 인상적이었다. 온갖 불상들 중 내 걸음이 오래 멈춘 곳은 당연히 타라보살 앞이었다. 얼마 전 달라이 라마는 관음보살의 눈물에서 태어났다는 타라보살의 진언을 반복해 음송하면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병의 확산을 완화하고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나는 젊은 승려들의 독경을 들으며 그 진언을 입속에서 웅얼거렸다.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쏘와하(om tare tutaare ture svaha)!
티베트 난민들의 평화를 기원하며 사원을 나왔는데 어린 동자승 한 명이 구멍가게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기꺼이 그 동자승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기 앞에서 함께 웃었다.
포카라공항에서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다. 좁은 공항대합실에 갇힌 채 우리는 하염없이 전광판만 바라보기를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결국 평화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항의를 거듭하니 그는 활주로로 향하는 유리문을 조금 열어주었다. 세 명의 사내들은 대합실 건물 구석에 숨어 활주로를 바라보며 콧구멍으로 연기를 풀풀 뿜어냈다. 그때 저편에서 제복을 입은 사내가 우리를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왔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사진 제공=김도연 소설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