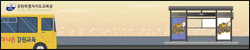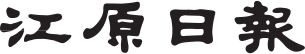실종된 우리 정치, 아무래도 중병이 났지 싶습니다. 원래도 종적을 감춘 적이 왕왕 있던지라 이번에도 곧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만, 햇수로 벌써 3년, 이러다 조만간 사망선고를 받고 영원히 회복 불능이 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멱살을 잡아 제자리에 돌려놓은 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가장 근자의 일은 누가 뭐래도 ‘촛불 혁명’이겠죠. 몇 날 몇칠을 촛불로 밤을 밝히며 어르고 달래어 가까스로 되돌려놓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너무 우악스럽게 대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한층 까칠해진 우리 정치는 그만 ‘검판(檢判) 통치시대’의 한복판으로 내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공정’과 ‘상식’을 시그니처(signature) 삼아 ‘소통’을 부르짖으며 날리는 어퍼컷을 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 정치는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뛰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짐은 썩 좋지 않았죠. 기대 만발의 ’출근길 문답(door-stepping)‘이 중구난방의 억측과 오해만 부르는 지뢰 밟기(stepping)가 되어 아직도 행방불명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 정치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 터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서 있던 곳은 증오와 혐오의 칼날을 세우고 호시탐탐 상대의 약점을 찌를 기회만 엿보는 사생결단의 격투장이 되었습니다. 자객이 날아다니고 호위무사가 춤을 춥니다. 메신저(messenger)를 공격하여 메세지를 공중 분해하는 치졸한 트릭은 정치 클리셰가 된 지 오래고, 궤변과 말장난, 결사옹위와 갈라치기는 돋보이려는 자들의 필살기가 되었습니다. ’선택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온전히 이해되는 공정과 법치는 진작에 스타일을 구겼고, ‘법대로’의 기치 아래 솟은 고발과 고소의 주먹은 수시로 난타전을 벌입니다. 누가 봐도 ‘누워서 침 뱉기’이고 ‘제 우물에 독 타기’인데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 정치를 응원할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정치가 흑화되지만 않기를 바라자는 누군가의 체념도 으스스하게 들립니다.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정치가 흑화라니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 속에 민생의 꽃을 피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우리 정치에 고품격 하이클래스 협치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나 갈등과 반목, 유아독존과 상대 절멸이 득세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지에 몰린 우리 정치, 이러다 진짜 흑화되어 돌아올까 걱정입니다.
한편으론 측은합니다. 무관심과 냉소를 견디며 그럭저럭 명맥을 유지해온 우리 정치이니까요. 그러던 차에 운명 같은 ‘팬덤’을 만나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누구는 이를 ‘새로운 시대의 주권자 권리’라 칭송하고 누구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라며 힐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를 경전 삼아 정치 신심(神心)을 쌓는 수많은 무명씨(無名氏)들의 환호와 갈채는 어느새 확증편향의 헬(hell)로 이끄는 사이렌이 되어 우리 정치의 고막을 찢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 은둔이 너무 길어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마음 가득했어도, 막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먼저 죽을 것만 같은 게 우리 정치였나 봅니다. 정치가 살아야 만물이 소생하는 K-국민의 필연이겠죠. 지난날의 흑역사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찾아온 이 봄, 거리에 펄럭이는 총선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보며, 우리 정치의 무사 생환을 기원합니다. “정치야, 죽지 말고 돌아와!”